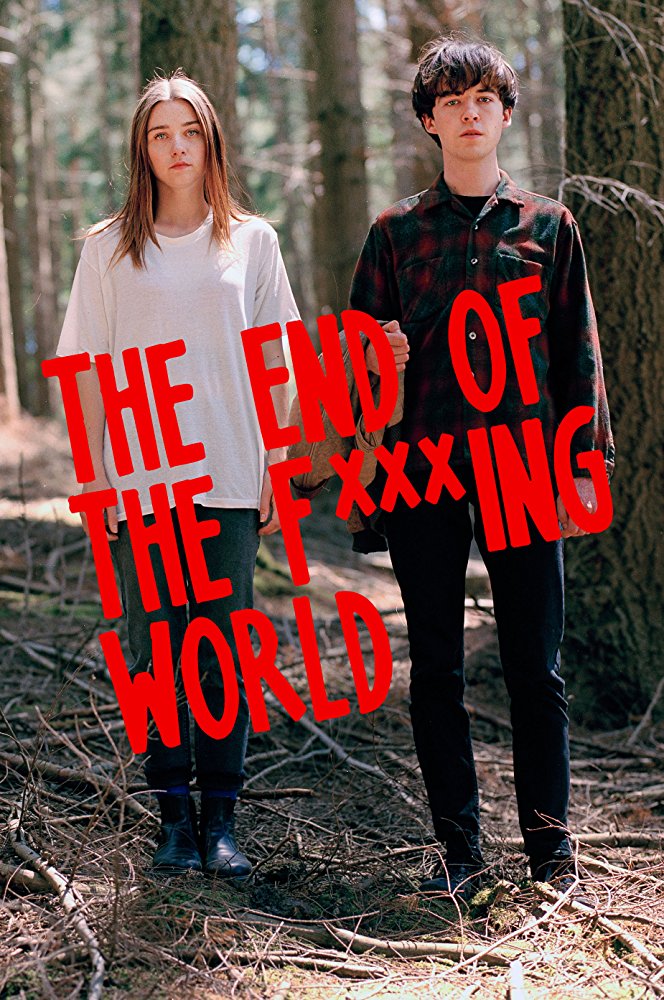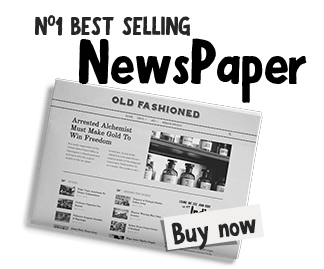“부동산 자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면 ‘(사회적) 보험 욕구’는 줄어들지 않을까?…중장년층 중 상당한 저축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성장의 수혜’를 받은 자들은 사회보험욕구를 내치는 동시에,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와 보편적 안전망 수립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지 못하면, 어느 정도의 (사회적) 보험 욕구를 갖고 있던 (소득 기준) 중산층과 중상층이 보편복지 동맹에서 이탈하여 선별복지 지지 세력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철승 서강대 교수, <쌀 재난 국가> 265~272쪽)
<쌀 재난 국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고민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책이다. 그렇다. 사회적 시스템을 벼 농사냐, 밀 농사냐로 구분하는 일원론적 인식이 거북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하지만 책을 읽어 나가면서 저자의 날카로운 분석에 어느덧 매료 당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인용한 부분이 책의 핵심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겨봐야 할 포인트를 놀랄 만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 가끔은 줄기에서 뻗어 나온 가지의 꽃이 황홀하게 빛날 때가 있다.
과연, 이철승 교수의 지적대로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집 없는 이들이 마음 둘 곳을 없게 했다. 반면 아파트를 가진 이들에게는 심리적 자산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노후가 보장되는데, 각자도생이 가능한데 무엇이 걱정이란 말인가. 지난해 후배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형, 요즘 386 선배들 만나면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해요. 집 있어서 다행이다, 집 없는데 죽겠다, 누구는 강남에 집이 있어서 좋겠다… 이러려고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던 겁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이 결국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를 낮추게 될 것이란 <쌀 재난 국가>의 지적은 부정하기 어렵다. 아파트 가격이 치솟음에 따라 중산층들은 아파트 한 채의 자산을 바탕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는 믿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진보는 ‘보편’의 힘을 믿는 것이다. 보수가 적자생존과 각자도생이라면 진보는 적응하지 못한 자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기는 것이다. 속칭 ‘진보정권’의 실패한 정책 대응이 진보의 기반인 ‘보편에 대한 믿음’을 궤멸시켜버린, 이 희대의 상황을 보면서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