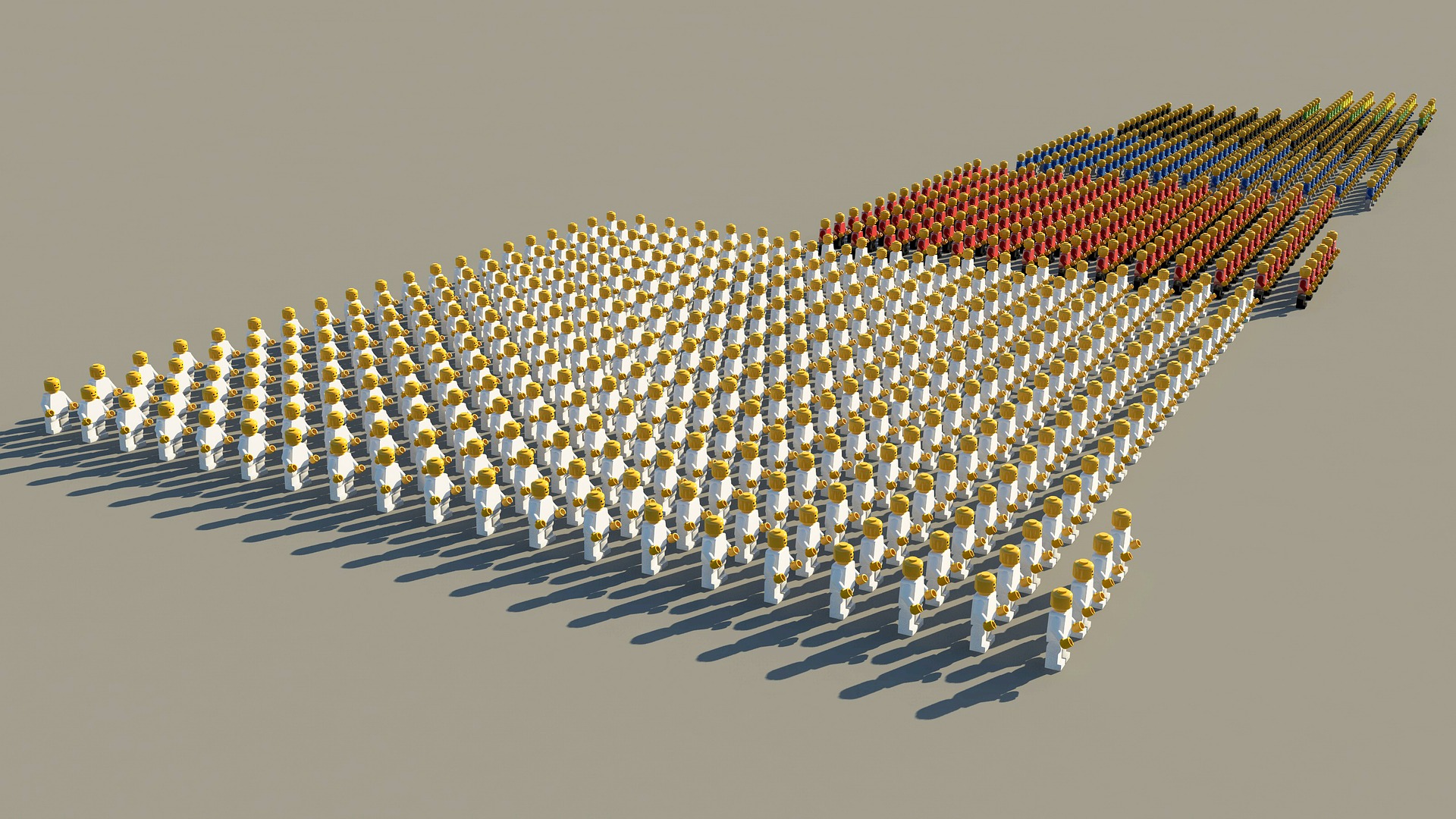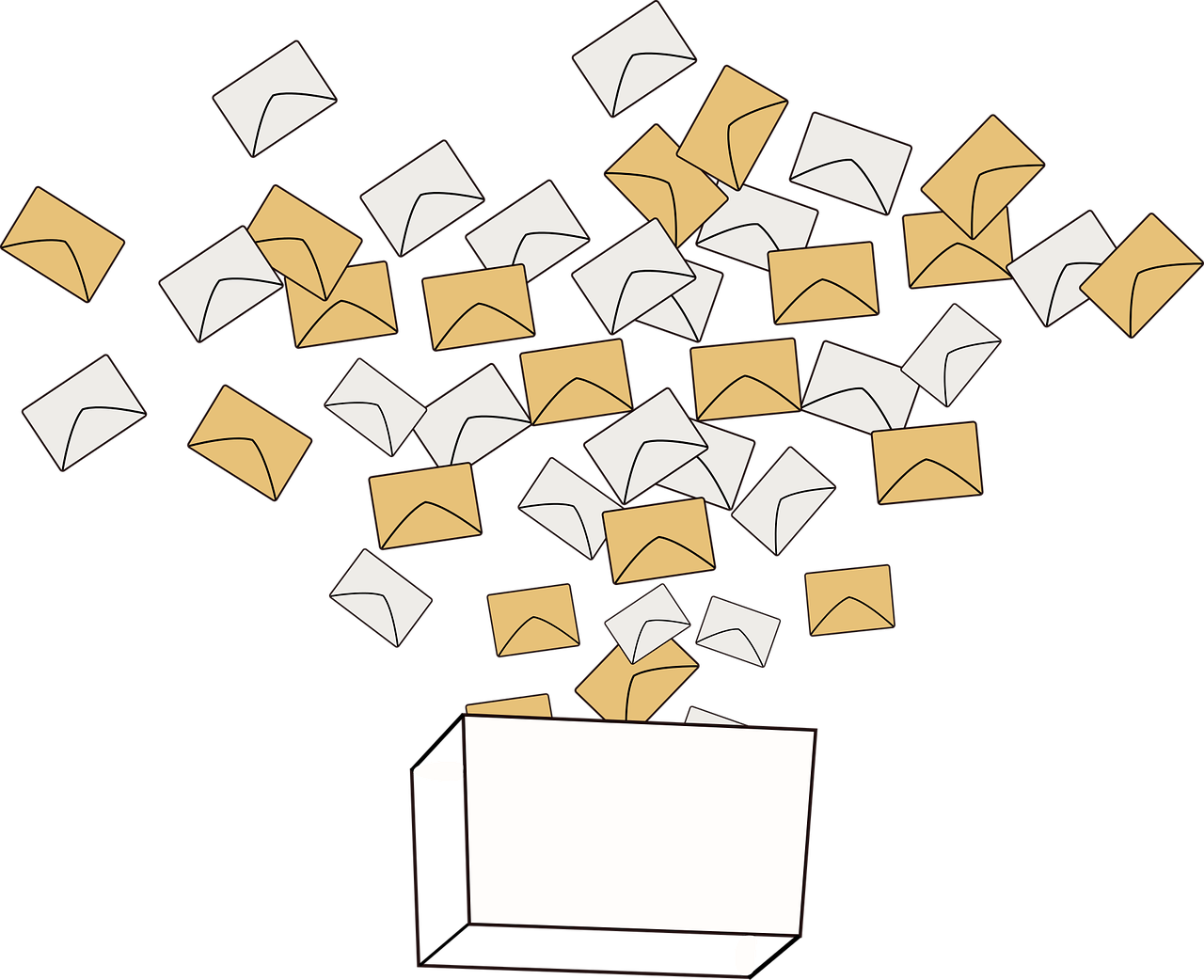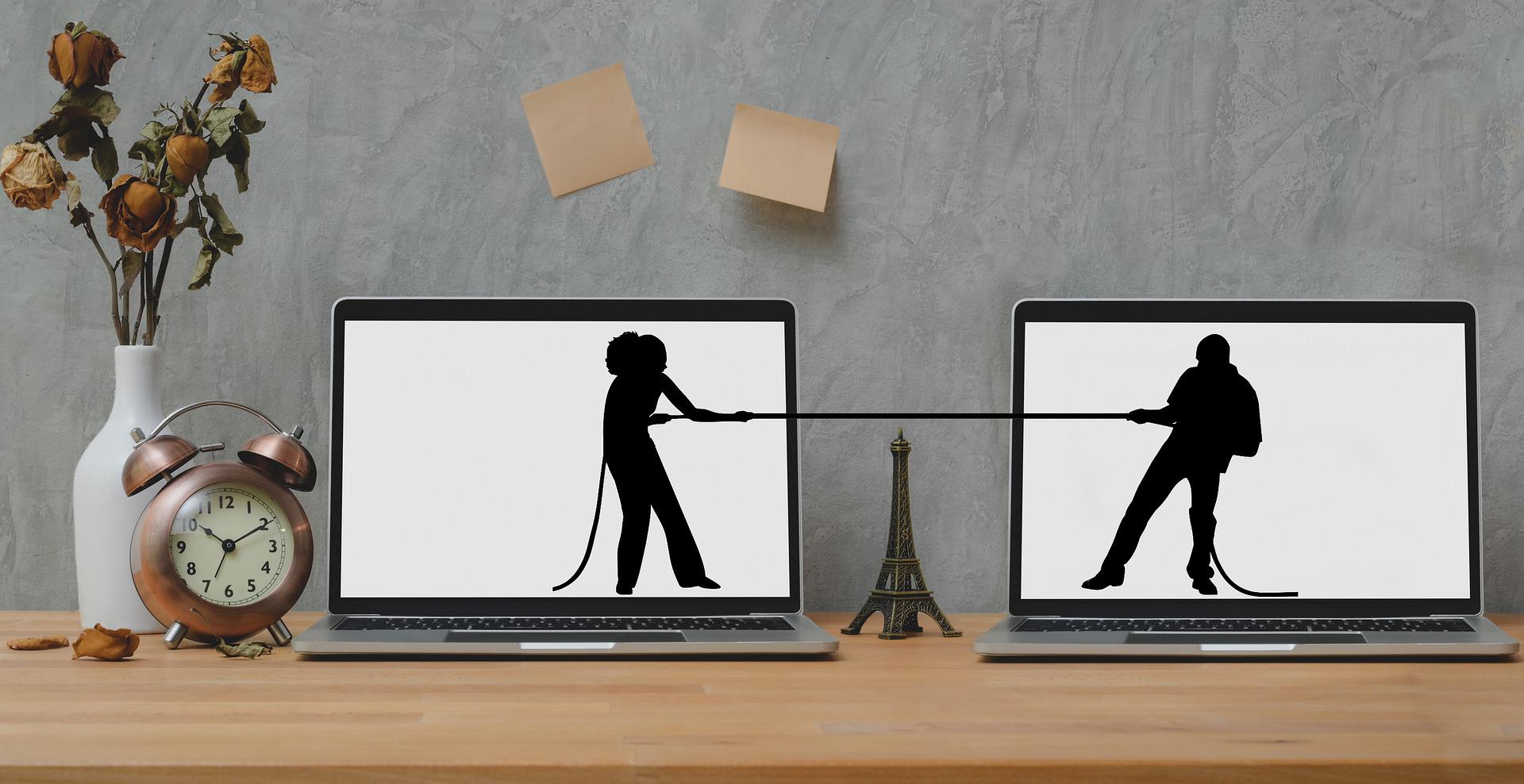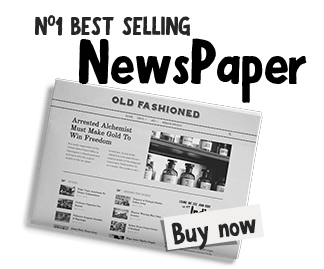“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똑같은 말을 할 것이라는 생각과 감정을 일컬어 여론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여론을 말할 때 사람의 말은 조잡해지고 공격적이 되고 감정적이 되는 거야.”
대담집 <침묵하는 지성>에서 일본의 철학연구가 우치다 타츠루는 이른바 ‘여론’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여론이 조잡해지고 공격적이 되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일정 수를 넘으면 누구도 자신에게 그 말에 대한 검증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지.” 한마디로 ‘여론’이라는 말 앞에서는 쉽게 무책임해져서 한없이 가볍게 발언한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위기도 이 언저리에 있다. 많은 이들이 두 개, 세 개로 쪼개진 여론에 몸을 기대고 있다. 증거도 근거도 논리도 없고, 생각이 다른 이를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도 없고, 자신이 내뱉는 말에 두려움이나 각오 같은 것도 없다. 우치다는 “언론은 독창적인 생각 없이 ‘여론’만 실어 나르고 있다”고 개탄하지만 다른 영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무책임하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여론이라고 뭉뚱그리기 전에
합리적 근거 있는지 따져 봐야
보라. 정치인들은 ‘국민 여론’을 금과옥조로 여긴다. 물론 여론은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라곤 자기 진영의 여론을 잔뜩 부풀려서 자극적으로 떠들어대고, 상대진영의 여론을 꼬집고 비트는 것뿐이다. 그렇게 ‘속시원한 사이다’ 노릇을 할 때 박수가 쏟아지고 팬덤이 생긴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행정관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여론’의 지배를 받는다.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도 역풍이 예상되면 한사코 입을 다문다.
그렇다면 사법은 어떠한가. 정치가 다수결이라면 사법은 소수자 보호다. 사법이 빛나는 순간은 사회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다. 모두가 돌을 던지는 피의자·피고인에게도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란 원칙이 지켜지느냐에 사법의 실력이 달렸다. 수사현장의 경찰관, 조사실의 검사, 법대의 판사가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댓글 동향에 촉각을 세운다면 눈 앞의 당사자들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가. 진실이 여론조사로 발견되는가. 시민은 왜 그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가.
여론의 위험성은 그마저도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자주 만나는 지인들의 잡담을 여론으로 오인하기 일쑤다. 대개 같은 대학, 같은 로스쿨을 나왔거나 같은 직업이거나 같은 교회,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다.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겨도 마찬가지다. SNS 친구들은 철저히 자신의 취향에 맞춰진 알고리즘에 따라 ‘헤쳐모여’를 한다. 이 에코 챔버(echo chamber·반향실)의 여론이 전부인줄 알고 살아간다.
정체불명의 여론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여론’이라고 뭉뚱그리기 전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논리가 무엇인지 따져보자. 둘째, 한번 더 생각하자. 처음에 드는 생각은 머릿속에 뿌리 박힌 통념일 가능성이 크다. 셋째, 지인들과 만나면 “오늘은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 선언하자. “서로의 얘기를 하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마지막으로, 이 순간 나 한 사람이라도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자. 언론도, 정치도, 사법도 ‘여론’ 추앙하길 멈추고, 고독한 고민에 잠길 때 뭔가 새로운 장(場)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