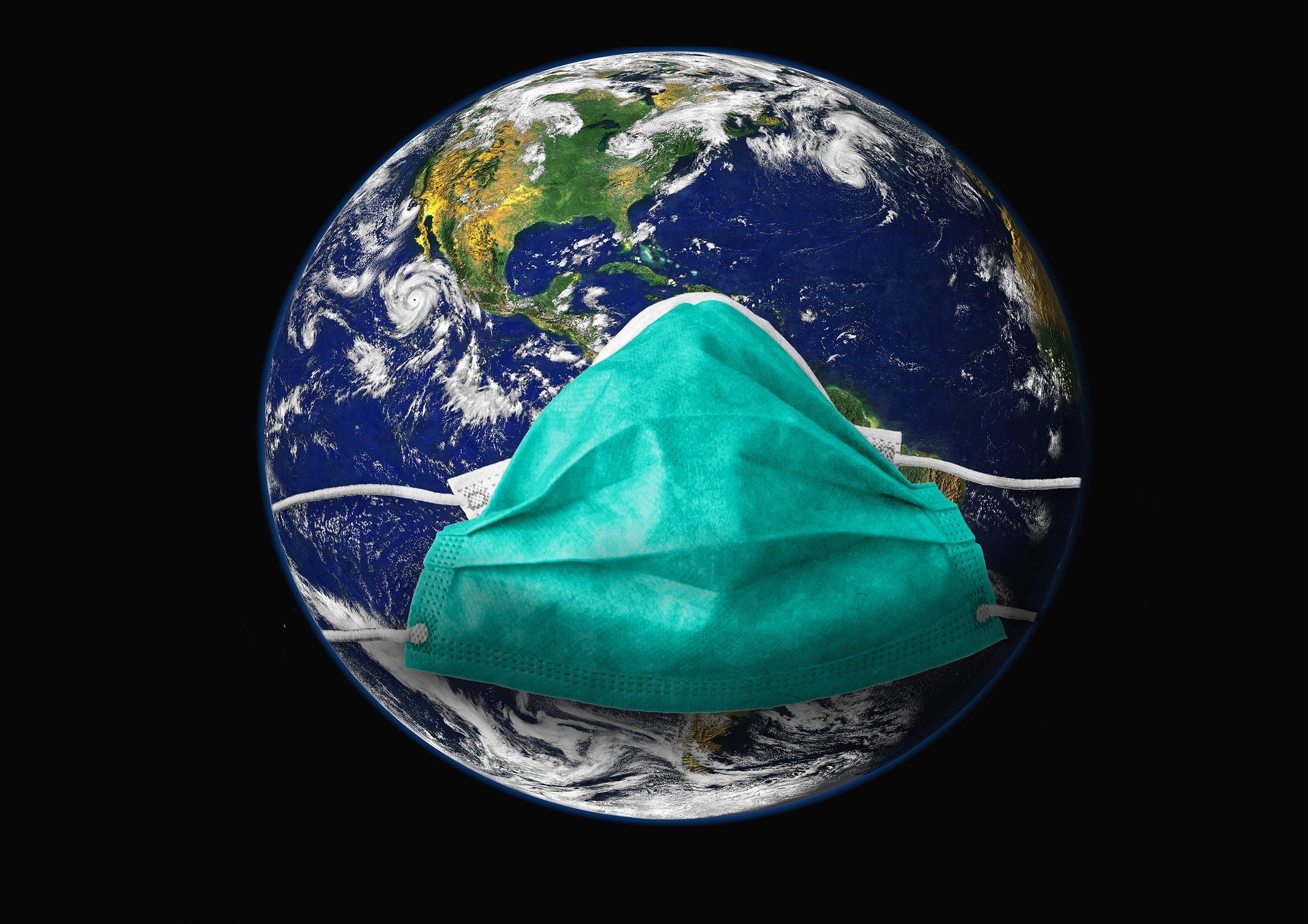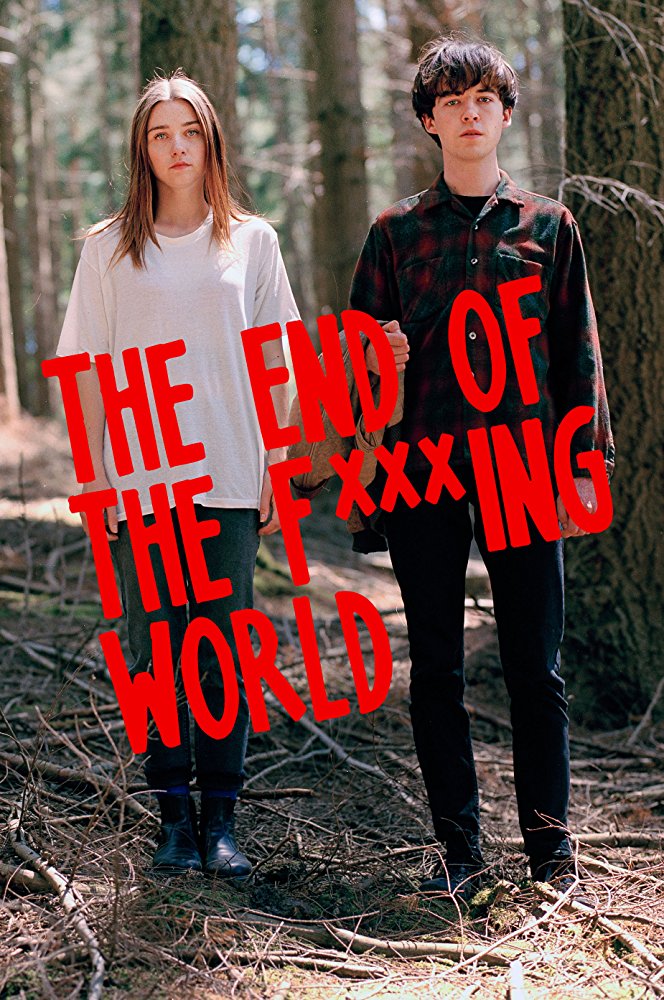“우리가 사는 세계를 들여다보면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임에도 억지로 누구 때문이라고 떠넘기거나 자기 책임이라며 떠안는 상황이 종종 눈에 띕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혀를 데면 카페 탓, 일시 퇴원한 할아버지가 집에서 경단을 먹다 목이 막혀 질식사를 하면 퇴원시킨 병원 탓, 독감에 걸리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탓, 암이나 당뇨병에 걸리면 평소의 생활습관 탓을 하는 것이지요.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그렇게 책임을 추궁 당하면 사회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립니다. 이런 상황은 매사에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합리적 판단으로 그 원인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현대사회의 신념이 불러일으킨 불행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미야노 마키코, 이소노 마호,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 116~117쪽)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을 넘기고, 이제 터널 끝이 보이는 듯하다. 매일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숫자가 발표되는 나날을 살다 보니 늘 쫓기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오미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전까지는 누군가 확진됐다는 소식을 접하면 ‘좀 조심하면 좋았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던 게 사실이다. 확진된 이들 역시 자신 때문에 검사를 받게 된 밀접접촉자들에게 면목 없어 하는 상황이 이어지곤 했다. 하지만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은 없었을 터.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감염됐던 것 아닌가. 왜 한쪽은 눈살을 찌푸리고 한쪽은 미안해해야 했을까.
<우연의질병, 필연의 죽음>은 말기 암으로 죽음을 앞둔 철학자가 의료인류학자와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책이다. 두 사람은 질병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원인을 찾아내려는 인간의 습성’이 어떤 편견을 만들어내는지 말한다.
우리의 일상은 인과관계 찾기의 연속이다.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의학상식을 알려준다는 프로그램이 나온다. ‘이 습관이 이 병을 낳는다’ ‘이걸 먹으면 안 되니 저걸 드시라’는 식이다. 이런 류의 방송들을 접하다 보면 특정한 질병의 뒤에는 반드시 특정한 원인, 그것도 특정한 생활습관이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된다. 그 결과,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이들이 자책을 하거나 “좀 조심하지 그랬느냐”는 비난까지 받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나 역시 지인이 병에 걸렸다거나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조건반사적으로 혀를 끌끌 찼다. 술을 덜 마셨으면 간이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 평소에 운동을 했으면 면역력이 생겼을 텐데… 고기를 덜 먹었으면 혈압이 높아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책임 찾기일 뿐이고, 병에 걸린 분께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 “모든 병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란 전제 자체가 팩트에 맞지 않는다. 어쩌면 ‘한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는 사건을 너무 쉽고 가볍게 다루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