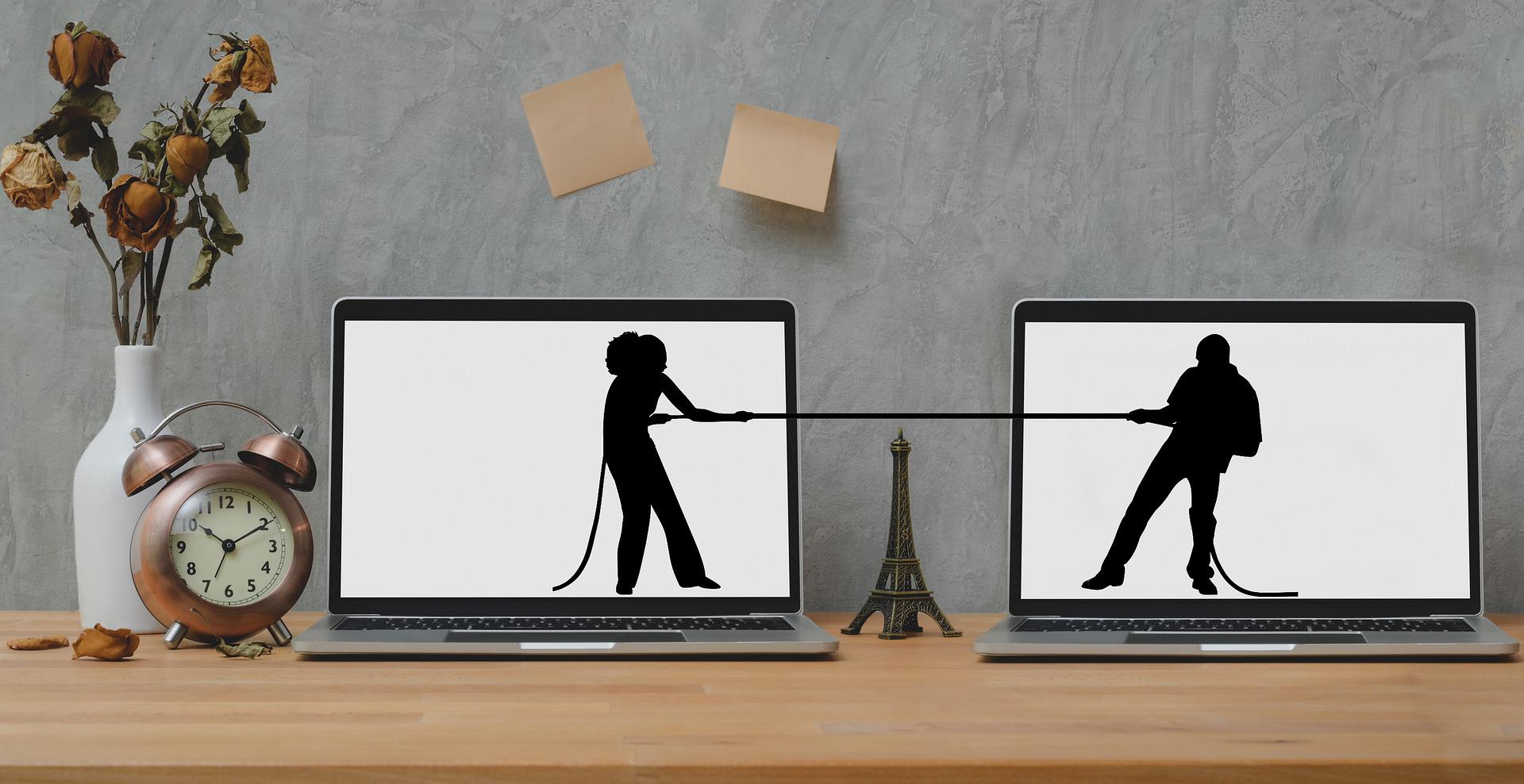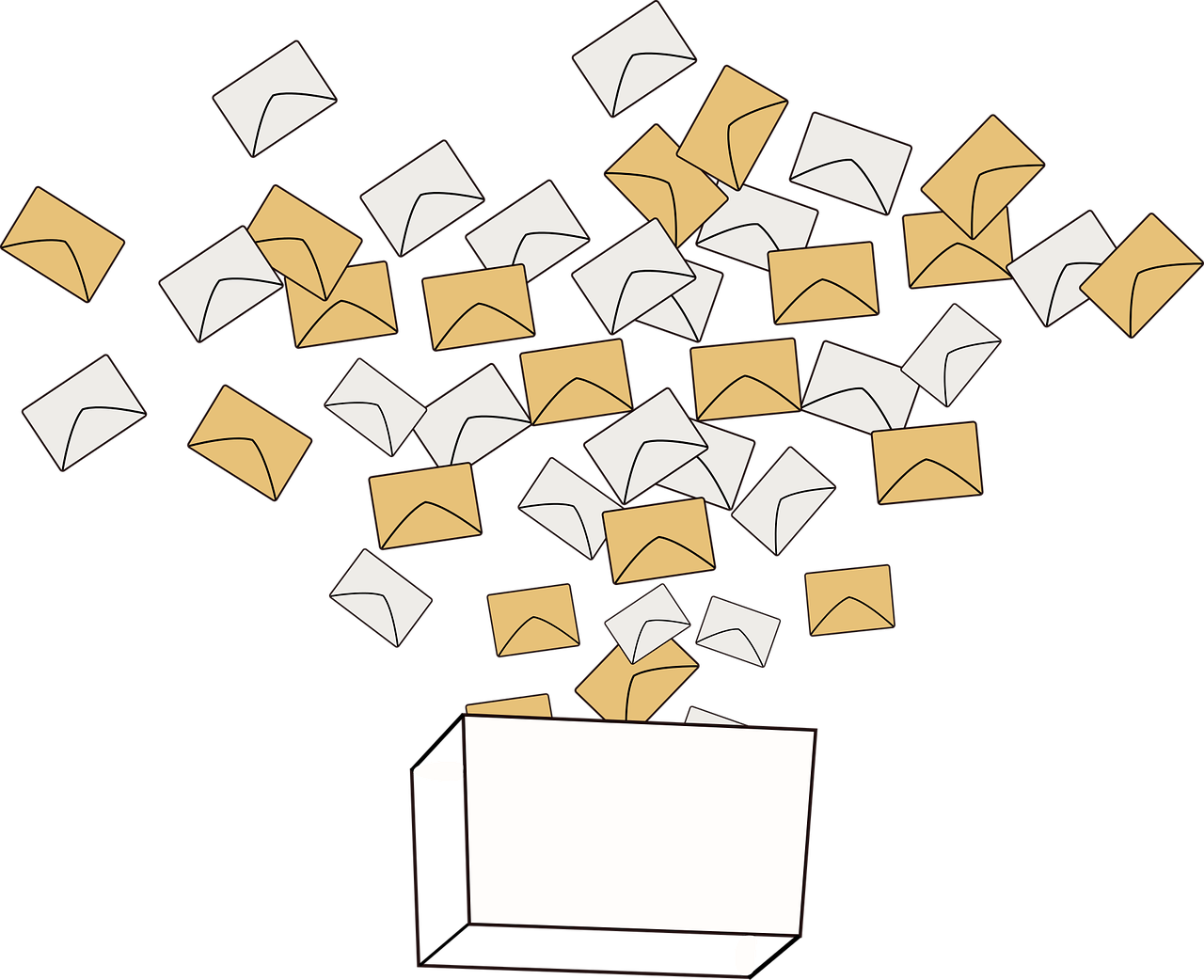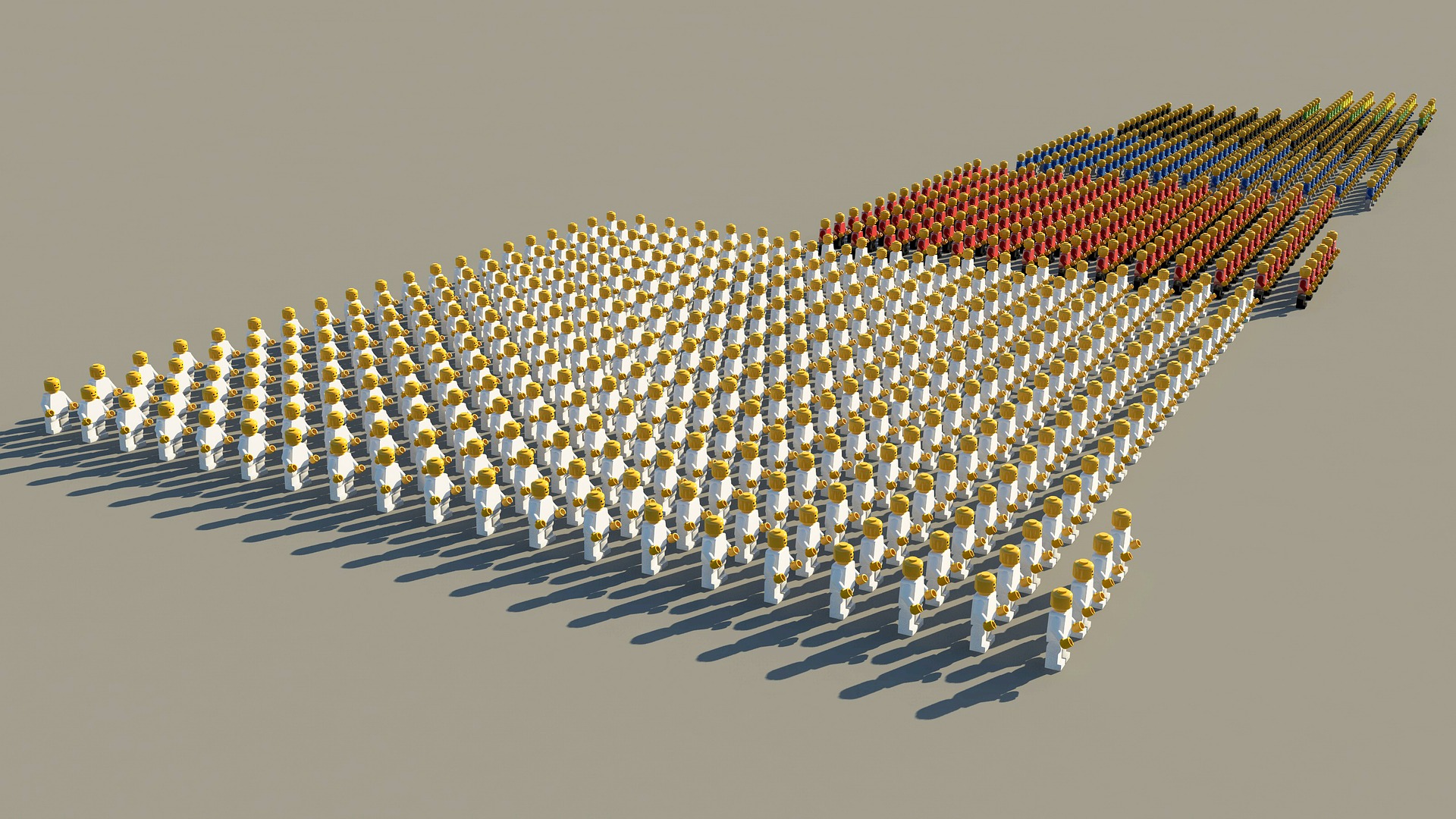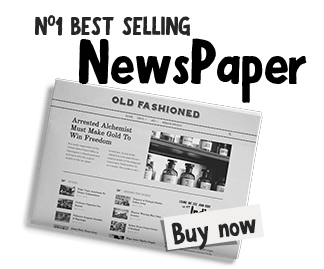한 시대를 보는 눈은 어디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에 따라 또 한번 달라진다. 그러므로, 한 시대를 말할 때는 어디에 서서, 무엇을 보려고 했느냐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오항녕 교수의 <조선의 힘>은 시대를 보는 관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과연 조선시대는 전근대적인 사회이고, 조선의 성리학은 전근대적인 이데올로기인가. 아무 의미도 없는 봉건의 잔재인 것인가. 다만 그 뿐인가.
예를 들면, 광해군이다. <조선의 힘>은 광해군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큼지막한 물음표를 그려 넣는다 광해군은 병자호란 때 우유부단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 인조와 달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반정 세력의 쿠데타로 부당하게 쫓겨난 임금’ ‘실용주의 외교로 백성들을 보호한 군주’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로 대처한 현실주의자’
조선시대, 혼군(昏君)이란 비난을 받아온 광해군, 그리고 그의 시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건 언제부터일까. <조선의 힘>은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서라고 한다. 일본 식민사학자 이나바 이와키치가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광해군이 부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광해군=현실주의자’ 평가는 철저히 식민주의 프레임 안에 있다는 게 오항녕 교수의 지적이다. “힘의 강약에 따라 시세를 좇는 외교방식”을 현실주의로 치켜세움으로써 “식민지인으로 전락한 사람들을 골수부터 일본제국주의에 투항시키는 유력한 수단”으로 쓰였다는 거다.
<조선의 힘>은 임해군과 영창대군의 죽음부터 대규모 궁궐 공사, 기회주의 외교에 이르기까지 광해군의 정치를 가차없이 비판한다. “조선의 사회와 백성들은 광해군 15년 동안의 시간을 ‘잃어버렸다’. 민생회복, 사회통합, 재정확보, 군비확충, 문화발전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이 반대로 흘러갔다.” ( 쪽)
이러한 오항녕의 인식은 ‘콩쥐-팥쥐 논법’에 대한 비판과 같은 연장선 위에 있다. 그가 말하는 ‘콩쥐-팥쥐 논법’이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정책이나 견해를 선/악 구도로 환원하는 ‘근대 한국 역사학의 포폄론’을 말한다. 이 신종 근대 포폄론은 당색과 근대주의를 배경으로 대중의 편견을 강화하며 교묘하게 기생하고 있다.”(223쪽)
<조선의 힘>은 명분과 실리를 이분법으로 갈라놓고 명분은 헛된 것, 실리는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명분과 실리는 같이 가면 좋은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명분 없는 실리는 오래가지 못하고, 실리 없는 명분은 공허한 것이다. 곧 원칙 없는 정책, 비전 없는 정책이 오래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쪽)
우리 역시 ‘콩쥐-팥쥐 논법’으로 시대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쪽은 무조건 선이고 한쪽은 무조건 악이라는 구도는 틀릴 때가 많다. 일방적으로 좋은 사람도,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도 없다. 선의와 악의, 이기심과 이타심, 개인의 욕망과 윤리적 의무감이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선악의 점묘화를 그리는 것이 현실 속의 우리들이다.
한 시대와 그 시대의 인물에 대한 평가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조선이 망한 것이 비단 고종 한 사람의 탓이었을까. 물론 고종이 군주의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운영했다면 상황이 좀 바뀌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당시는 서구열강의 제국주의가 숨가쁘게 식민지 경쟁을 하던 시점임을 상기해보자. 군주 한 사람이 막기엔 역부족 아니었을까. 전세계를 휩쓸던 제국주의 팽창의 압력에 취약한 고리였던 조선이 무너져 내린 것 아닐까. 오항녕은 조선의 망국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자연사(自然死)할 만큼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격이랄까?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을 당한 것이다.” (‘조선, 차라리 빨리 망했다면? ‘亡國 콤플렉스’에 하이킥!’ 프레시안 2010년 8월 27일 기고)
고종의 잘잘못은 역사가들이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 그래야 위정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정치를 할 것이다. 다만, 한 사람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한 사람이 잘해서 나라가 흥했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 아닌가.
‘콩쥐-팥쥐 논법’은 동시대의 사회 안에서도 횡행한다. 누군가는 콩쥐가 되고, 다른 누군가는 기필코 팥쥐가 된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김보름 선수의 ‘노선영 선수 따돌림’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는 노 선수가 콩쥐였고, 김 선수가 팥쥐였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정반대로 바뀌었다. 김 선수가 콩쥐가 되고, 노 선수가 팥쥐가 됐다. 4년 전 김 선수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이번엔 어디에도 노 선수를 변호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콩쥐’가 있고, ‘팥쥐’가 있다. ‘콩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고 순수하고, ‘팥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교활하고 악독하다. ‘콩쥐’의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만 ‘팥쥐’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다. 변명을 하면 할수록 ‘악명’의 늪에 빠져들어간다. “그런 짓을 해놓고 뻔뻔스럽게 무슨 할 일이 있다고…”
익숙하다는 것은 길들여져 있다는 뜻이다. 이젠 너무나 익숙한 선/악 구도에 의심을 품을 때가 됐다. 누가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거나 일방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의심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설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한번은 물러서서 보아야 한다. 그래야 서로를 위한 안전거리가 확보된다.